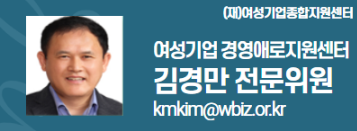“포괄임금제”약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
포괄산정임금제(또는 포괄임금제)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“포괄적으로” 약정하여 일정 금액의 임금을 정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여전히 많은 기업의 임금관리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남용될 경우,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침해 우려가 크므로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. 또한 ‘포괄임금 약정’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, 기업경영에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괄산정임금제 약정 시 여성기업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1.포괄임금 약정의 유효 요건
① 명확한 서면 합의
근로계약서에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이 기본급 외 별도로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예시: “기본급 300만원(기본급 250만원 + 연장/야간/휴일근로수당 50만원 포함)” 등 구체적이고 항목별로 기재합니다.
"기본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"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.
② 실제 근로시간과의 합리적 관련성
지급되는 법정 고정수당이 실제 수행되는 초과근로 시간에 비례해야 유효합니다.
예를 들어, 매주 20시간의 실제 초과근로가 발생하는데 5시간분의 수당만 고정 지급된다면, 불합리한 포괄약정으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
③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초과근로의 존재
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가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, 그렇지 않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2.포괄임금 약정의 종류
① 정액급제 포괄임금
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고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.
사례 연구
A사 |
매일 8시간씩 주5일 근무를 약정하면서 추가적인 연장·휴일·야간근로 유무와 관계없이 포괄해 월급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월 3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:
⇒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라면 근로자에게 지급된 포괄임금 300만원 전체가 소정근로의 대가인 기본급으로 취급됨.
⇒ 통상시급은 14,354원(3,000,000만원÷209시간)이 되며,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
⇒ 근로자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645,930원(14,354원×30시간×150%)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. |
B사 |
매일 9시간(소정근로 8시간, 연장근로 1시간)씩 주5일 근무를 약정하면서 추가적인 연장·휴일·야간근로 유무와 관계없이 포괄해 월급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월 3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:
⇒ 정액급제 포괄임금 약정으로 인정되지만 당초부터 매일 8시간의 소정근로와 1시간의 연장근로를 전제로 임금을 책정했으므로 통상시급 산정방식이 달라지게 됨.
⇒ 통상시급은 12,396원[3,000,000만원÷209시간+33시간(22×1.5)]이 되며, 포괄임금 300만원에는 약정한 1일 1시간분(총22시간분)의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취급됨.
*실제근로일수 22일 전제
⇒ 근로자에게 사전에 약정된 시간(30시간)을 초과하는 8시간분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48,760원(12,396원×8시간×150%)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. |
② 정액수당제 포괄임금
기본급을 미리 정하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연장·휴일·야간근로 유무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.
사례 연구
C사 |
매일 8시간씩 주5일 근무를 약정하면서 추가적인 연장·휴일·야간근로 유무와 관계없이 매월 (기본급 250만원 +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50만원=총액300만원)을 지급하면서 월 3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:
⇒ 기본급이 250만원임을 전제로 근로자의 실제 연장·휴일·야간근로가 사전에 약정된 정액수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분을 정산·지급해야 함.
⇒ 통상시급은 11,962원(2,500,000만원÷209시간)이 되며,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50만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취급됨.
⇒ But,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법정 연장근로수당 30시간분은 538,290원(11,962원×30시간×150%)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38,29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. |
D사 |
매일 8시간씩 주5일 근무를 약정하면서 포괄하여 월급 300만원을 지급하되, 그 안에 연장·휴일·야간근로수당 10시간분이 포함되어 있고 추가적인 연장·휴일·야간근로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적인 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면서 월 3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:
⇒ 통상시급은 13,393원[3,000,000만원÷(209시간+10시간×1.5)]이 되며,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기본급은 2,799,130원(13,393원×209시간)이고 정액수당은 200,895원(13,393원×10시간×150%)이 됨.
⇒ 회사는 1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한 것으로 취급되므로, 근로자에게 추가로 401,790원(13,393원×20시간×150%)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. |
3.불법적인 포괄약정으로 판단되는 경우
① 기본급과 수당 구분 없이 “총액만” 약정
“연봉 3,600만원으로 한다”라는 약정만 존재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, 포괄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② 근로시간 기록 미작성
포괄임금제라도 근로시간 기록은 의무입니다.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다툼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
③ 법정수당 금액을 임의로 정함
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“야근수당 30만원” 식으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, 실제 근로시간보다 수당 금액이 적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.
4.판례상 유효한 포괄임금제 요건
“초과근로가 정기적·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, 그 시간과 임금산정이 번거롭고 복잡한 경우에 한해, 포괄임금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. 단, 근로자와의 자발적이고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, 일률적·형식적 도입은 무효다.” - 대법원 2014다232316 판결 - |
5.실무상 유의 및 권장 사항
① 포괄임금제 적용이 특히 위험한 경우
- 사무직·전문직 등 비교적 자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
-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재량이 많은 직무
- 명확한 기록 없이 "관행적으로" 도입한 경우
② 권장 사항
- 근로계약서 작성: 연장/야간/휴일 수당을 각각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
- 근로시간 관리: 타임카드, 출퇴근 시스템 등 근로시간 기록 필수
- 수당 책정 기준: 최근 3개월간 실제 초과근로시간 평균치 기준으로 고정수당을 책정하여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
- 근로자 동의 확보: 근로자가 포괄임금제의 의미와 조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한 자료 확보
- 취업규칙 반영: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경우,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확히 기재하여 규정화하고 근로자가 숙지하도록 조치